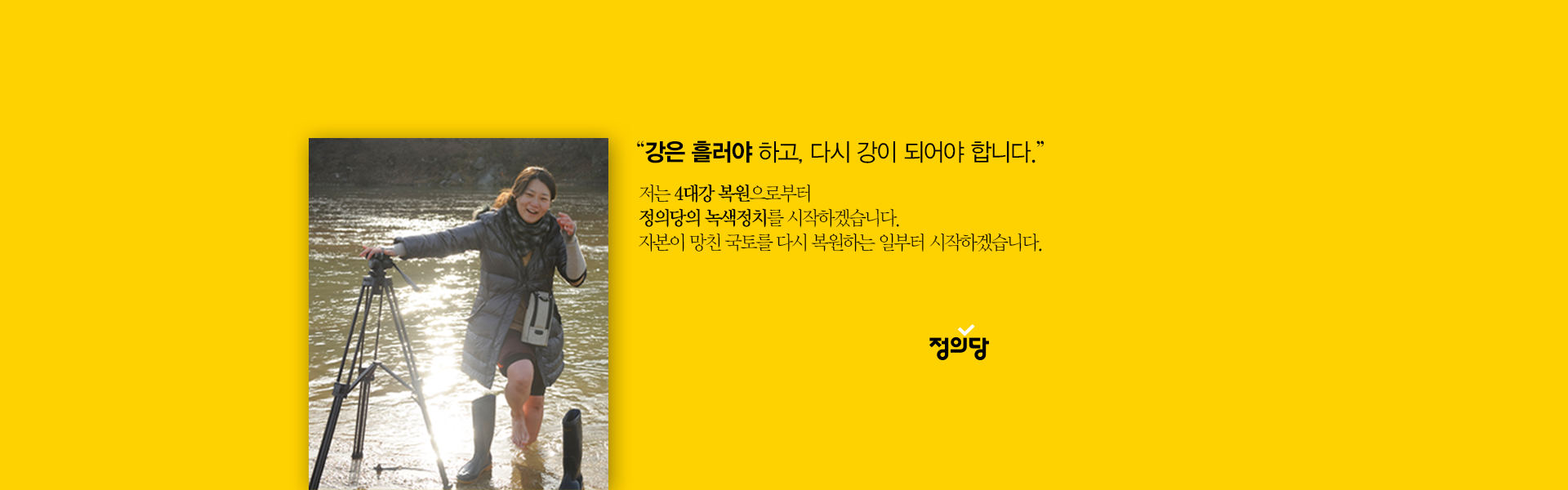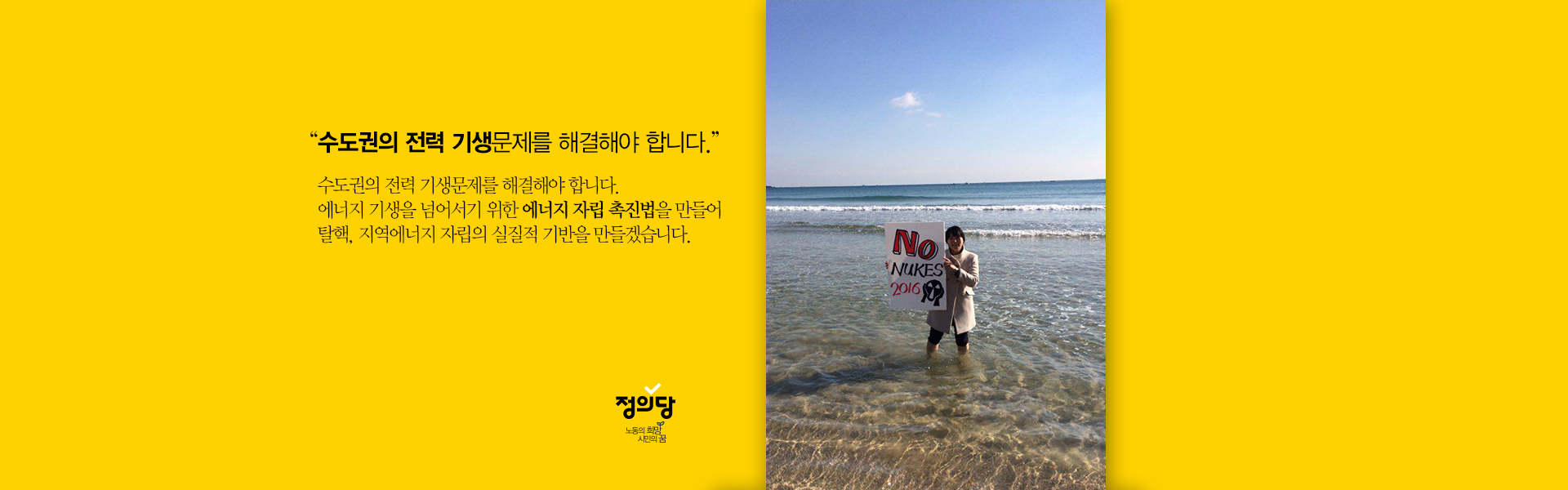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82004155&code=990402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갈등 문제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원수인 바닷물에 고리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삼중수소는 물에 섞인 오염물질이 아니라 일반 수소를 대신해 물분자 자체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포함한 어떤 정수처리 공정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 안전성’의 문제가 기장군만의 문제인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그런 시설이 왜, 거기에 자리 잡았는가”를 보자.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해 물과 관련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점 관리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물을 경제성과 품질을 고려해 선택할 수 없다. 그냥 정부가 공급해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물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물밑에서진행되고 있다.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는 함께 ‘물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의 주역인 ㄷ기업의 이름이 해수담수화와 함께 언급돼 있다. 또한 총 1954억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 시비와 함께 706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수십개의 지자체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단계를 밟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이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해수담수 공급의 강행은 물 민영화 실현 계획의 일부로 봐야 한다.
상수도와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독점적’인 사업이 ‘민영화’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물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둘째, 운영 노하우나 기술이 사기업의 영역으로 이전되고 자체적으로 발전되어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장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먹는 물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1991년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먹는 물 안전성을 외면하고 고의적으로 페놀을 방류한 범죄였다.
'이현정의 녹색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녹색&노동 2편: 마담 퀴리는 왜 죽었는가 -노동자에게 해로운 물질은 생태계에도 해롭다. (1) | 2015.12.03 |
|---|---|
| 녹색&노동 1편: 도시와 문명, 그리고 은폐된 노동 -인간 생태계에도 분해자가 있다. (0) | 2015.11.23 |
| 성찰과 전망, 진보정당 안에서의 녹색정치② -오래된 미래, 녹색과 적색의 만남과 엇갈림 (0) | 2015.09.03 |
| 성찰과 전망, 진보정당 안에서의 녹색정치① -오래된 미래, 녹색과 적색의 만남과 엇갈림 (0) | 2015.09.01 |
| [기고]평창 D-1000, 분산 개최 결정 골든타임 (0) | 2015.05.15 |